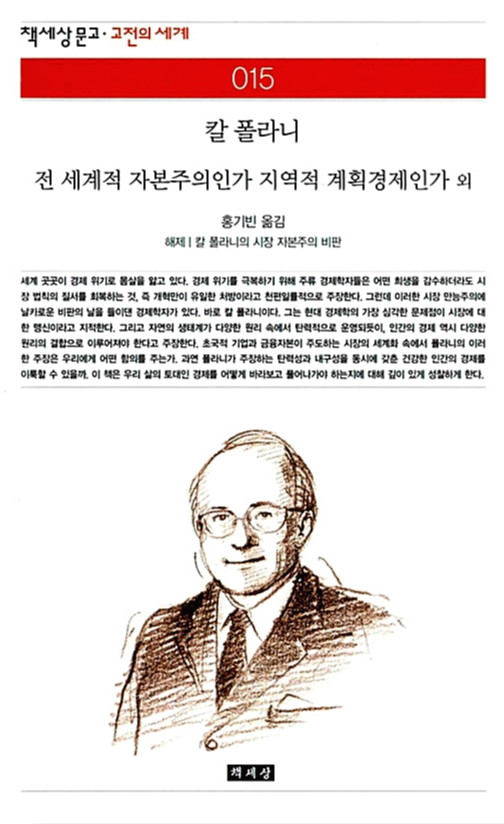
2. 인간, 자연, 생산 조직
[0068-1]
01. 이중적 운동이 현대 사회 흐름 지배. 시장 체제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
02. 1914년, 시장 체제 발전 최고조. 새로운 삶의 방식이 보편성을 주장하며 전 세계로 확산.
03. 동시에 반대 운동. 로버트 오언은 시장 경제 진화 내버려두면 “거대하고 영구적인 악을 낳을 것” 경고.
04. 생산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 생산 과정이 자기 조정 메커니즘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과 자연은 판매를 위해 생산된 재화 즉, 상품으로 전락. 그에 따라투자되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짐. 이론적으로 이는 다양한 생산 영역에서 여러 소득들을 자동으로 평준화시키는데 필수적.
05. 반대 운동의 핵심은 생산 요소인 토지와 노동에 관한 시장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 개입주의(interventionism)의 주요한 기능
[0070-1~0071-1]
01. 생산 조직도 같은 이유로 위협받음. 사업을 벌여놓은 기업은 생산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격이 모두 같은 비율로 떨어지지 않는 한 파산하지 않을 수 없음. 그러나 실제 가격 수준의 하락은 전반적 비용 하락이 아닌, 통화 체제 조직되는 방식이 원인.
02. 자기 조정 시장에선 시장 활동 자체가 구매력을 공급 및 규제. 고전파의 화폐이론 "화폐는 상품이며 우연히 화폐로 기능하게 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화폐의 양을 통제". -> 은행 혹은 정부가 시장 밖에서 통화를 창출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시장의 자기 조정 방해하는 것.
03. 결국 자기 조정 시장은 노동, 토지, 화폐 세 가지 모두 위협하는 것. 이에 따른 보호 운동 1)산업에 종사하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공장 및 사회 입법이 필요, 2)자연 자원과 농촌 문화 보호를 위해 토지 관련 법률과 농업 관세 나타나, 3)상품 허구를 화폐에 적용하는 데 내포된 위험에서 생산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 은행과 관리 통화 체제가 필요했음.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조직 그 자체도 자기 조정 시장의 파괴적 효과 피하기 위해 숨을 곳이 필요했다는 것.
[0072-1] 사회 내 두 원리와 갈등
01. 사회 안에 작동하는 두 가지 원리. 1)경제적 자유주의, 자기 조정 시장의 확립을 목적, 자유 방임과 자유 무역이라는 방법 선택. 2) 사회 보호의 원리, 인간, 자연, 생산 조직 보호 목적, 주로 노동 계급, 토지 계급의 다양한 지지에 의존해 보호 입법, 경제 규제를 위한 연대 및 기타 경제 개입 수단 방법.
02. 계급은 중요한 요소. 토지, 중산, 노동 계급이 담당했던 역할이 19세기 사회사 전체 모양을 결정. 1)중산 계급, 막 생겨난 시장 경제의 담지자들. "중산 계급은 이윤이 사회 전반에 혜택을 준다는 거의 성스럽기까지 한 믿음을 발전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기능을 수행". 그러나 이들은 "생산 확장"만큼 인간 생활에 중요한 "다른 이익들"에 관한 수호자 자격 상실.
03. 노동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게 된 보편적인 인간의 이해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버림. 19세기 말 보통선거의 보편화로 노동 계급은 국가에 큰 영향력 행사. -> 중산 계급은 산업 영역의 주도권이 정치 권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
04. 한 쪽은 정부와 국가를 그에 맞서 다른 쪽은 경제와 산업을 자신들의 권력 거점으로 삼고 갈등 심화하여 사회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됨. 사회의 핵심적인 정치/경제 영역이 분파적 이익을 위한 투쟁의 무기로 남용. -> 이 파괴적 교착상태가 이어져 20세기 들어 파시즘의 위기 도래.
'Karl Polanyi 읽기 >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독서노트]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006 (0) | 2020.02.28 |
|---|---|
| [독서노트]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005 (0) | 2020.02.27 |
| [독서노트]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003 (0) | 2020.02.26 |
| [독서노트]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002 (0) | 2020.02.24 |
| [독서노트]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001 (0) | 2020.02.23 |



